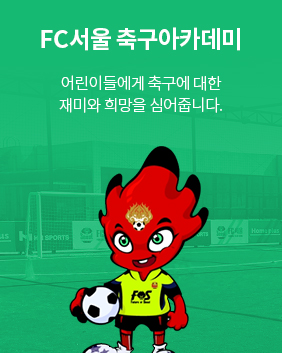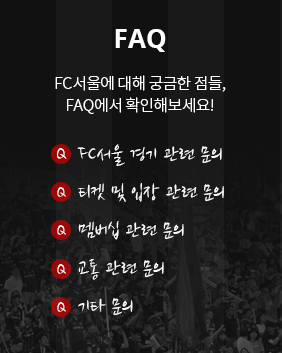돌아보면 만족보다 아쉬움이 가득했던 2007년. 새롭게 다가온 2008년을 바라보는 눈에 기대감이 한껏 담겨있는 것은 아마도 2007년에 진하게 새겨졌던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2007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결코 시원섭섭하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은 FC서울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다가온 2008년은 FC서울다운 시작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며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 FC서울은 이미 달라질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곱씹으며, 신선한 에너지를 모자람 없이 채워둔 FC서울, 이제 출발만 남았다.

세르비아 특급, 데얀의 합류
지난 시즌 인천 소속으로 36경기 20골(FA컵, 컵 대회 포함) 3도움을 기록했던 데얀. 폭발적인 공격력을 과시했던 그가 2008년부터 FC서울의 검붉은 유니폼을 입는다.
눈부신 볼 키핑 능력과 차가우리만치 침착한 문전에서의 움직임, 거기에 타고난 골 감각까지 데얀에게는 ‘특급’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K리그에 입성한 첫 해 36경기 20골 3도움, 특급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이유다. 물론 FC서울이라는 새로운 팀에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성공적으로 1년 만에 K리그에 완벽히 적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FC서울 적응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데얀의 합류로 FC서울의 공격라인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김은중, 박주영, 정조국, 이상협 등 기존 FC서울의 공격을 책임지던 선수들에 이어 데얀까지, 중요한 순간의 한 골이 아쉬웠던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2년 차 감독 세뇰 귀네슈
프로 스포츠에서 ‘적응’이라는 단어는 중요하고 또한 무서운 단어다. 가지고 있는 능력에 상관 없이 적응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겠지만 프로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단어가 바로 ‘적응’이다. 선수뿐 아니라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소위 말해 팀 리빌딩 기간이 감독에게는 바로 그 적응기간인 셈이다.
지난 시즌 FC서울의 지휘봉을 잡아 명문구단과 명문감독의 만남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세뇰 귀네슈 감독. 쾌속 질주했던 초반과 달리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대표팀 차출이라는 걸림돌로 주춤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다른 결과를 기대해 봐도 좋을 듯 하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적응기간이 끝났다는 것. FC서울의 지휘봉을 잡은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2008시즌, 2007시즌은 팀을 포함해 국내 축구에 적응하는 시기였다면 이제 그 적응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펼치는 것만 남았다. 큰 걸림돌이었던 차출 역시 국내 축구계 환경의 일부분이고 한 번 겪어본 이상, 그에 대한 대비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을 터.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나 팀을 처음 맡아 적응하랴 지휘하랴 바빴던 지난해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선수들 역시 세뇰 귀네슈 감독의 지휘스타일에 적응을 마쳤을 터.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감독이 어떤 플레이를 원하고 선수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적응 뒤에 돌아오는 결과, 기대해 봐도 좋을 것이다.

그들의 제자리 찾기
무엇보다 FC서울의 2008시즌이 반가운 이유는 2007시즌 FC서울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부상의 악령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줄 선수들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핑계일지도 모르겠으나 중요한 순간마다 FC서울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선수들의 부상은 지난 시즌 FC서울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내는데 있어 한몫 단단히 했던 골칫거리였다.
선수들이 제자리를 찾는 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렇지 못했던 지난 시즌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유독 부상 선수가 많았던 공격라인에 김은중, 박주영, 심우연을 비롯해 이민성 등 부상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을 선수들, 든든하고 또 든든하다.
다가올 2008시즌, FC서울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한다. 새로워질 FC서울의 모습을 기대해 보며 개막전을 손으로 꼽다 보면 이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그들의 질주를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글=공희연 FC서울 명예기자











 K League 1
K League 1